[이희용의 글로벌시대] 해외여행 자유화 30년…글로벌 에티켓은 몇 점?
송고시간2019-01-07 10:15
(서울=연합뉴스) 30년 이전만 해도 해외여행은 특권이었다. 돈이 많거나 시간 여유가 있다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었다. 해외 파견 근로자나 무역회사 직원, 출장 가는 공무원이나 기자, 유학생과 교수, 국가대표급 운동선수와 문화예술인 등이 고작이었다. 귀중한 외화의 유출을 막고 공산권 국가 공작원에게 포섭될 우려를 방지한다는 게 명분이었으나 국민 통제를 손쉽게 하려는 권위주의 정권의 의도도 깔려 있던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에는 관광 목적으로는 여권을 내주지 않았다. 공무 등 확실한 사유가 있어야 했다. 대부분 복수 여권이 아닌 단수 여권을 발급해 해외에 나갈 때마다 여권을 새로 만들어야 했다. 까다로운 신원조회를 거쳐야 했고 반공연맹(현 자유총연맹)이 주관하는 소양교육도 받아야 했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나는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란 제목의 소책자를 나눠줬는데 내용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와 경제 발전상, 국제 에티켓, 공산권 주민 접촉 시 유의사항 등이었다.
여권 소지자는 선택받은 소수였다. 김포공항에는 장도(壯途)를 성원하는 환송객이 몰려와 비좁은 청사가 늘 북적거렸다. 환전도 액수를 엄격히 제한해 주변 친지에게 선물을 돌리려면 그 돈으론 대부분 부족했다. 당시에는 외국에 갈 일이 드문 데다 외제와 국산의 품질 차이가 커 너도나도 자신이 쓸 생활용품과 주위에 나눠줄 선물 꾸러미를 한 아름 들고 귀국하는 게 보통이었다. 남대문시장 인근의 암달러상에게 필요한 외화를 더 바꿔서 나가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세계적 추세나 시대적 물결에 따라 더는 국민의 해외여행을 막기 어려웠다. 결정적 계기는 1981년 9월 30일 서독 바덴바덴에서 전해진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 유치 소식이었다. 다음 달에는 1986년 제10회 아시안게임 개최지도 서울로 정해졌다.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대외 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정부는 1983년 1월 1일 50세 이상 국민에 한해 200만 원을 1년간 은행에 예치하는 조건으로 연 1회 유효한 관광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1987년 9월부터는 관광여권 발급 최저연령을 45세로 낮췄다.
해외여행 제한이 완화되던 초창기, 여행사의 광고를 보면 일본 5박 6일 패키지 상품이 55만5천800원, 17박 18일간 일본을 거쳐 미국을 돌아보는 일정이 206만 원이었다. 당시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의 월급이 20만 원 안팎이었으니 상당히 비싼 가격이었다. 꽉 막혔던 해외여행의 물꼬가 터지다 보니 글로벌 에티켓을 무시한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이른바 '싹쓸이 쇼핑'으로 물의를 빚는 일도 종종 있었다.
일본 여행객들의 최고 인기 상품은 코끼리표(조지루시·象印) 전기밥솥이었다. 1983년 1월 시모노세키 부인회와 교류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부산 주부모임 회원들이 이 밥솥을 몇 개씩 사 들고 출국하는 광경이 일본 일간지에 가십으로 실려 망신을 당했다. 경찰이 환전 과정 수사에 나서 여행사 직원 두 명이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가 하면 전두환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내며 한국형 전기밥솥 개발을 지시했다는 일화도 낳았다.
평화적 정권 이양과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자신감을 얻은 정부는 1989년 1월 1일부터 해외여행을 전면 자유화했다. 병역 등 일부 제한 조치가 있긴 했지만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전 국민이 외국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게 된 것이다. 해외 신혼여행과 대학생들의 해외 배낭여행도 이때부터 붐을 이뤘다. 소양교육이란 이름의 반공교육은 1992년까지 계속되다가 폐지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1982년 내국인 출국자 수는 49만9천708명이었다. 직업별로는 기술자 18만2천155명(선원·의사·운전사), 상인(회사·공업·농업) 17만8천3명, 교수·학생 3만6천900명, 종교·문화·체육인 1만1천763명, 공무원 5천695명, 군인 1천249명, 언론인 1천49명, 국회의원 323명, 국제기구 요원 25명 등이었고 기타 8만2천548명이었다. 이 수치는 1988년 100만5천320명으로 늘어나고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첫해인 1989년 152만9천48명으로 급증했다. 이후 가속도가 붙어 2005년 1천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2016년 2천만을 넘어섰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지난해 11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8년 1∼11월 국민 출국자는 2천643만2천587명으로 12월까지 합치면 3천만 명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 입국자는 2012년 1천만을 넘겼고 2016년 1천741만여 명을 기록했다가 2017년 1천356만여 명으로 떨어졌다. 2018년 1∼11월 누계는 1천428만여 명을 기록해 국민 출국자와 외국인 입국자의 비율은 약 65대 35다.
한때 국제 관광업계에 '어글리 코리안'(추한 한국인)이란 말이 유행했다. 잠옷 바람으로 호텔 로비를 어슬렁거리고, 공항 대합실에서 화투를 치고, 관광지에서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드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었다. 돈 좀 있다고 거드름을 피워 현지인의 손가락질을 받거나 섹스 관광으로 외교적 문제를 일으키는 일도 있었다.
지금이라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듯하다. 4일에는 지난 연말 미국과 캐나다로 해외연수를 떠난 예천군의회 의원 가운데 일부가 술에 취해 가이드를 폭행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는가 하면, 숙소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다른 투숙객들의 항의를 받고, 가이드에게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 데려가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도 샀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8월 '여권만큼 중요한 에티켓 챙겨가세요'란 제목의 캠페인을 전개하며 '우리 모두를 위해 지켜야 할 10가지'와 '실천하면 모두가 행복한 10가지'를 여행객에게 알려왔다. 호텔 비품 몰래 가져가기, 비행기에서 신발을 벗고 돌아다니기, 문화재에 낙서하기 등이 해서는 안 되는 대표적 행위다. 반대로 현지 문화 존중하기, 초면에 개인적인 질문 하지 않기 등은 실천을 권장하는 에티켓이다.
한국에 온 외국인을 보고 그 나라 국민을 판단하듯이 외국에 나간 한국인은 우리나라를 비추는 창이나 다름없다. 요즘에는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어글리 코리안의 행동이 전 세계에 실시간 중계된다. 남을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욕 먹이는 일만큼은 삼가는 게 글로벌 시대를 사는 세계시민의 본분이고 예의다. '여권(旅券) 파워' 세계 3위라는 나라에서 30년 전처럼 출국 예정자를 모아놓고 소양교육을 시킬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한민족센터 고문)
heey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1/07 10:15 송고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가 이뤄진 지 2년여 만인 1991년 10월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가 배낭여행을 떠나는 대학생으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http://img1.yna.co.kr/etc/inner/KR/2019/01/06/AKR20190106050400371_04_i_P4.jpg)
![해외여행이 전면 자유화되자 1989년 2월 일본대사관 앞에 평소보다 갑절이 많은 사람이 비자를 받으려고 줄을 늘어서 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http://img3.yna.co.kr/etc/inner/KR/2019/01/06/AKR20190106050400371_02_i_P4.jpg)
![1989년 해외여행이 전면 자유화된 직후 신문에 실린 해외여행 광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제공]](http://img2.yna.co.kr/etc/inner/KR/2019/01/06/AKR20190106050400371_03_i_P4.jpg)
![지난해 9월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로 나가려는 여행객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을 가득 메우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http://img0.yna.co.kr/etc/inner/KR/2019/01/06/AKR20190106050400371_05_i_P4.jpg)
![[이희용의 글로벌시대] 해외여행 자유화 30년…글로벌 에티켓은 몇 점? - 5](http://img4.yna.co.kr/etc/inner/KR/2019/01/06/AKR20190106050400371_01_i_P4.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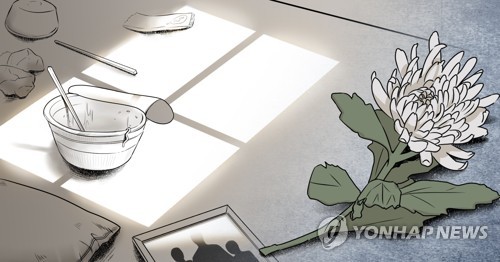



![[2보] "이스라엘 미사일, 이란 내 목표물 타격"<미 ABC방송>](http://img5.yna.co.kr/photo/etc/up/2024/04/15/PUP20240415005301009_P2.jpg)

![[영상] '충격적' 칠레 시골 첨단 대마농장…"중국 마피아 연관 가능성"](http://img1.yna.co.kr/mpic/YH/2024/04/19/MYH20240419007300704_P4.jpg)
![[영상] 이란군 핵사령관 "이스라엘이 핵시설 공격하면 핵원칙 재검토"](http://img0.yna.co.kr/mpic/YH/2024/04/19/MYH20240419008500704_P4.jpg)
![[영상] 아낌없이 주는 대리모 해달…새끼는 어미 배 위에서 '쿨쿨'](http://img7.yna.co.kr/mpic/YH/2024/04/18/MYH20240418011800704_P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