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흑백 영화 속을 거닐다
송고시간2019-06-13 08:01
고성 왕곡마을
(고성=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고성 왕곡마을은 19세기 전후로 만들어진 북방식 전통가옥 50여채가 원형을 간직한 채 옹기종기 모여 있는 민속 마을이다.
학창 시절 교과서를 다시 펼쳐보듯, 최근에 본 흑백 영화의 한 장면으로 들어가듯 고즈넉한 마을을 천천히 걸었다.
왕곡마을의 역사는 14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가 멸망하고도 절개를 지킨 72명의 유신(遺臣) '두문동 72현' 중 한 명인 함부열은 간성(현 고성군청 소재지)으로 유배된 공양왕을 따라 낙향했고, 함부열의 손자인 함영근이 5㎞ 정도 떨어진 이곳 왕곡마을에 정착하면서 이후 양근 함씨가 집성촌을 이뤄 살고 있다.
◇ 사람과 동물이 함께 겨울을 나는 집
마을은 19세기 전후 지어진 북방식 전통가옥들이 원형을 유지한 채 잘 보존되고 있는 것이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0년 국가민속문화재(제235호)로 지정됐다.
바다에서 겨우 1.5㎞ 들어와 있지만 나지막한 다섯 개의 봉우리에 둘러싸여 있어 아늑한 산골 마을 같다. 배가 동해에서 송지호를 거쳐 마을로 들어오는 길지 형상이라 전란에도, 강원도의 흔한 산불에도 화를 입지 않았다 한다.
오음산에서 흘러내려 오는 왕곡천을 따라 난 안길을 중심으로 집들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데, 집과 집을 구분하는 건 담장이 아니라 그사이의 제법 널찍한 텃밭이다.
이곳의 전통가옥에는 한옥이라고 하면 흔히 떠올리는 대청마루가 없다. 휴전선이 생기기 전 북한 땅이었던 이곳은 겨울이 길고 추운 남쪽의 최북단.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관북 지역의 가옥 형태인 겹집 구조가 이곳까지 내려왔다. 채광이나 통풍보다는 열 손실을 줄이는 데 최적화된 구조다.
50여채의 전통가옥 중 주민이 떠난 빈집 여덟 채를 정부가 사들여 숙박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중 북방 전통가옥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ㄱ자형 기와집 '큰상나말집'에 먼저 들렀다.
남쪽으로 난 널찍한 마당은 햇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대문도, 담도 없다. 눈이 많이 쌓였을 때 고립되지 않기 위함이기도 하다. 같은 이유로 기단도 높이 쌓아 올렸다. 대신 집 뒤로는 담을 쌓아 차가운 북서풍을 막고 뒷마당과 부엌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겨우내 대부분의 가사 활동이 이뤄지는 부엌은 다른 방들을 합친 것보다 크다. 부엌에는 ㄱ자의 머리 방향으로 외양간이 붙어있는데, 신기하게도 실내로 이어져 있다. 길고 혹독한 겨울에 아궁이의 온기를 짐승도 함께 나누는 것이다. 굴뚝에 항아리를 얹어 놓는 것도 불씨가 초가지붕에 옮겨붙는 것을 막으면서 조금이라도 열을 가두어 놓으려는 생활의 지혜다.
마당과 부엌을 잇는 출입문은 한 사람이 간신히 드나들 정도로 좁고, 화장실과 창고가 있는 별채 방향으로 난 부엌의 다른 문이 대문인 셈이다. 본채에 난 다른 문들도 대부분 드나드는 문인지, 창문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작다.
소가 없는 빈 외양간에는 커다란 물독과 키, 설피(雪皮) 같은 세간살이가 걸려 있다. 아궁이에 걸린 솥은 여전히 반질반질 윤이 나고, 오래전 사용했던 찬장과 화로도 한켠에서 세월을 증명하고 있다. 널찍한 부엌은 불을 켜지 않아 깜깜한데, 외벽의 나무판자 틈으로 오후의 햇살이 비껴들었다.
부엌 옆으로는 안방과 마루, 사랑방, 도장방(규방)이 밭 전(田)자 모양으로 다닥다닥 붙어있다. 마루는 꽤나 높아서 디딤돌을 밟고도 한껏 힘을 주고 올라야 한다. 흔히 보던 탁 트인 중남부 지방의 한옥과 달리 조밀한 방을 요리조리 들여다보고 있자니, 학창 시절 사회 교과서 어느 페이지, '지역에 따른 전통가옥 구조' 정도의 제목이 붙었을 단원에 등장했던 평면도가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한참이 지난 뒤에야 실물로 확인하는 겹집 구조의 한옥은 생각보다 더 아늑하고 옛 주인이 사용하던 그대로 남아있는 손때 묻은 마루와 오래된 가구들은 정겨웠다.
한겨울에는 숙박 체험을 운영하지 않음에도 너무 춥다는 민원에 부엌과 마루 사이에 중문을 달고 창호마다 새 문을 덧대는 바람에 창호지문을 활짝 열 수 없는 것이 도리어 아쉬웠다.
◇ '동주'의 행복했던 시절
왕곡마을과 큰상나말집은 시인 윤동주와 독립 운동가인 사촌 송몽규의 이야기를 담은 이준익 감독의 저예산 흑백 영화 '동주'(2016)의 주요 촬영지이기도 하다. 두 사람이 서울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 같은 해 태어나 함께 자랐던 백두산 북서쪽 지린성 명동촌 고향 마을 장면을 이곳에서 촬영했다.
시끌벅적한 예능 프로그램을 비롯해 많은 TV 프로그램이 이곳을 찾았지만, 영화 '동주'의 묵직한 잔향 덕에 흑백 영화 속 해사하고도 뜨거운 두 청년의 고향 마을로 각인됐다.
촬영이 이뤄진 마을 곳곳에 영화 속 한 장면이 담긴 사진들이 걸려 있다. 동주가 몽규와 만든 잡지를 아버지에게 보여주며 설득하다 혼났던, 몽규의 신춘문예 당선 소식에 들뜬 가족들 틈에서 당혹스러운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밥을 먹던 높고 좁은 마루, 밤에 호롱불을 밝히고 글을 읽고 시를 쓰던 작은 방이 그대로 눈앞에 있었다.
동주만큼이나 글재주가 있었고, 더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몽규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일장 연설을 했던 앞마당과 동주와 친구들의 아지트인 정미소도 영화 속 그대로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짧은 생을 마감하고 떠나가는 동주의 영혼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돌아볼 때, 몽규와 함께 개구쟁이 같은 가장 밝은 얼굴을 하고 탔던 그네와 등목을 했던 우물가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저녁노을이 내려앉기 시작할 때, 어느 집 굴뚝으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하나둘 따뜻한 불이 켜지는 마을 길을 천천히 걸었다. 불 피우는 냄새, 밥 짓는 냄새가 스미니 진짜 영화 속 한 장면으로 들어선 듯했다.
삐걱거리는 마루를 걷고, 바람에 덜컹대는 문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고, 창호지를 통해 들어오는 햇살과 새소리에 잠을 깨니 영화 속 체험은 오롯이 완성된다. 멀리 떨어진 화장실을 오가는 불편쯤이야 감수하고 남을 일이다.
문화재로 지정된 전통가옥은 구조나 외관에 함부로 손댈 수 없다. 다만 내부는 주민이 생활에 불편함을 줄이도록 고쳐 쓰고 있다. 숙박 체험을 하는 집은 화재 위험 등 때문에 부엌도 사용할 수 없고, 화장실 내부도 수세식으로 고치고 온수도 사용할 수 있지만 멀어서 불편하다.
그래서 방 2∼3개가 딸린 집 한 채 숙박 요금이 한여름 성수기를 제외하면 3만∼5만원에 불과하다. 숙박하지 않더라도 4∼10월에는 주말마다 짚풀 공예, 지게 지기, 전통 먹거리 만들기, 다도, 민속놀이, 국악 공연 등 다양한 전통 문화·민속놀이 체험이 열리기 때문에 아이들과 들르기 좋겠다.
숙박·체험 문의 및 예약 www.wanggok.kr ☎ 033-631-2120
※ 연합뉴스가 발행하는 월간 '연합이매진' 2019년 6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mih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6/13 08:01 송고
![고성 왕곡마을 전경 [사진/전수영 기자]](http://img8.yna.co.kr/etc/inner/KR/2019/05/17/AKR20190517067600805_07_i_P4.jpg)
![북방 전통가옥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큰상나말집 [사진/전수영 기자]](http://img2.yna.co.kr/etc/inner/KR/2019/05/17/AKR20190517067600805_03_i_P4.jpg)
![뒷마당 쪽으로 쌓은 담을 따라가는 고샅 [사진/전수영 기자]](http://img1.yna.co.kr/etc/inner/KR/2019/05/17/AKR20190517067600805_04_i_P4.jpg)
![부엌과 연결된 외양간 [사진/전수영 기자]](http://img3.yna.co.kr/etc/inner/KR/2019/05/17/AKR20190517067600805_02_i_P4.jpg)
![영화 '동주'에서 동주와 친구들의 아지트였던 마을 정미소 내부 [사진 전수영 기자]](http://img0.yna.co.kr/etc/inner/KR/2019/05/17/AKR20190517067600805_05_i_P4.jpg)
![노을이 내려앉은 저녁 풍경 [사진/전수영 기자]](http://img9.yna.co.kr/etc/inner/KR/2019/05/17/AKR20190517067600805_06_i_P4.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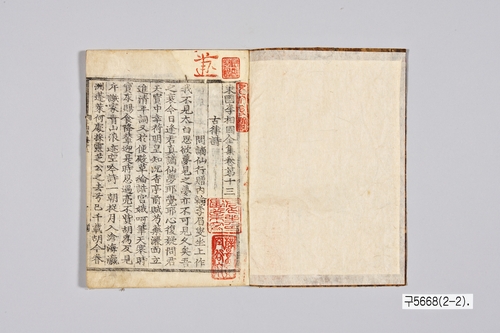


![[OK!제보] 머리뼈에 톱날 박혔는데 그냥 봉합…뇌수술 환자 재수술 날벼락](http://img2.yna.co.kr/etc/inner/KR/2024/04/19/AKR20240419033000505_01_i_P2.jpg)


![[영상] 이란 핵시설지역서 '쾅' 폭발음…이스라엘, 이란 본토 보복 타격](http://img2.yna.co.kr/mpic/YH/2024/04/19/MYH20240419015300704_P4.jpg)
![[영상] 무개념 행동 다 찍혔다…새끼곰 억지로 끌어내려 '인증샷' 찰칵!](http://img6.yna.co.kr/mpic/YH/2024/04/19/MYH20240419014600704_P4.jpg)
![[영상] 한미 특전사 공중침투훈련 성료…사상자 발생한 북한과 대비](http://img9.yna.co.kr/mpic/YH/2024/04/19/MYH20240419013800704_P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