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어때] 백 스물다섯 칸 고택에서의 하룻밤
송고시간2020-11-25 07:30
영광의 '숨은 보석' 매간당 고택
(영광=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굴비로 유명한 영광은 맛집뿐 아니라 둘러볼 만한 명소도 의외로 많은 고장이다.
상사화 군락지로 유명한 불갑산 기슭의 불갑사, 광활한 갯벌과 불타는 석양이 황홀한 풍경을 연출하는 백수해안도로, 서해 앞바다의 비경과 낙조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칠산타워…
군남면 동간리에 있는 매간당 고택은 이번 여행에서 발견한 영광의 숨은 보석이다. 민가로서는 국내 최대 규모인 125칸 저택은 남도 고택의 품격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다.
◇ 호랑이도 감복한 효심…임금이 '삼효문'을 내리다
벼가 누렇게 익어가는 황금 들판, 그 위를 한가롭게 거니는 왜가리 한 쌍, 시리도록 푸른 하늘 아래 하늘하늘 춤추는 코스모스. 가을 색이 완연한 농촌 풍경을 즐기며 차를 달리니 어느덧 동간리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저만치 우뚝 솟아 있는 고택의 대문이 눈에 들어온다.
대문에서 이미 125칸 저택의 위용이 느껴진다. 팔작지붕을 이고 있는 대문 위에 누각을 올린, 2층 구조다.
집 안으로 통하는 출입문도 두 칸이다. 오른쪽 작은 문이 평소 일반인들이 이용했던 문이다. 폭이 넓은 왼쪽 문은 지체 높은 어른이 가마를 타고 드나들 때만 열렸다고 한다.
대문을 받치는 기둥도 멋스럽다. 휘어진 아름드리 소나무를 다듬지 않고 그대로 썼다.
문설주 위를 가로지르는 나무는 위로 휘어있다. 가마의 출입을 용이하게 하려고 일부러 휘어진 나무를 사용한 듯하다.
2층 누각을 올려다보니 삼효문(三孝門)이라고 적힌 현판이 달려 있다.
여의주를 입에 문 처마의 용머리 장식이 범상치 않다. 민가에서 보기 힘든 것으로 궁궐에서나 썼던 장식이라고 한다.
당초문으로 장식된 계단을 따라 2층 누각으로 올라가 봤다.
한쪽으로는 황금 들판과 마을 전경이 내려다보이고 반대편으로는 집 안이 한눈에 들어온다.
위를 올려다보니 천장 장식이 무척이나 화려하다. 지붕을 받치는 구조물인 공포를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배열해 화려하게 장식한 다포 형식의 건물이다. 이 역시 민가에서는 보기 힘든 건축 양식이라고 한다.
대문에서부터 특별한 인상을 풍기는 매간당 고택은 연안 김씨 직강공파의 종택이다.
16세기 중엽 김영(金榮)이 영광군수로 부임하는 숙부 김세공을 따라 이곳에 오면서 연안 김씨 직강공파 집안이 이곳에 정착하게 됐다.
고택의 출발은 작은 초가였다. 현재 사당이 있는 자리가 대나무밭이었고 그 안에 초가 한 채가 있었다고 한다.
김함(1760∼1832)과 그의 며느리가 근검절약하며 길쌈으로 큰 부를 쌓으면서 가난했던 집안이 부흥해 대지주가 됐다고 한다.
현재의 고택은 김함의 손자인 매간 김사형(1830∼1909)에 의해 1868년 건립됐다.
'삼효문'이라고 적힌 현판에서 미뤄 짐작할 수 있듯 이 집안은 나라에서 인정하는 효자를 세 명이나 냈다.
하늘을 감동시킬 정도의 효자라야 받을 수 있다는 효자상을 3대에 걸쳐 받았다니 집안의 큰 자랑이 아닐 수 없다.
김진(1599∼1680)은 일흔에 가까운 고령에도 색동옷을 입고 재롱을 부리며 부모를 즐겁게 했다는 이야기가 실록에 전해진다. 부모상을 당하자 3년간 죽으로 연명하며 시묘살이를 했다고 한다.
김재명(1738∼1778) 역시 부모상을 당한 뒤 시묘살이를 했다. 그의 효심에 감복한 호랑이가 매일 밤 나타나 시묘살이하는 그를 다른 짐승들로부터 지켜줬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김재명의 아들인 김함은 한겨울에 두꺼비를 구해 아버지의 병을 낫게 했다고 한다.
솟을대문 위에 올려진 누각은 이들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고종이 내린 '정려'다. 보통 동네 어귀에 세웠던 정려를 솟을대문 위에 세운 것도 독특하다.
'삼효문'이라는 현판 글씨는 고종의 이복형이자 흥선대원군의 첫째 아들인 이재면이 쓴 것이라고 한다.
◇ 백 스물다섯 칸 저택의 위용
지체 높은 어른들만 드나들었다는 커다란 대문을 넘어 집안으로 들어섰다. 아궁이에 장작불 지피는 구수한 연기가 마당 안에 가득하다.
오랜만에 하룻밤 묵어갈 손님들을 맞은 고택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모습이었다.
중요민속문화재 제234호인 이 고택은 일반인들이 언제든 숙박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영광군이 주최하는 고택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신청한 일반인들에게 하룻밤 묵어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집안은 규모가 상당했다.
문간채가 딸린 솟을대문을 지나면 소박한 정원 왼편으로 남자들의 공간이었던 사랑채가 앉아 있다. 일자 형태의 사랑채는 뜻밖에도 남향이 아닌 북향집이다.
방향보다는 배산임수의 풍수에 따라 삼각산을 등지고 북쪽을 바라보고 있다. 궁궐에서나 썼던 둥근 기둥을 사용한 것도 눈길을 끈다.
사랑채와 ㄱ자로 연결된 중문간채를 지나면 여자들의 공간인 안채가 아래채 및 곳간채와 마주 보고 있다. 정면 9칸, 측면 2칸 반 규모로 지어진 커다란 곳간채는 고택 주인이 막대한 부를 누렸음을 보여준다.
안채는 일자형인데 동서 양쪽에 두 채, 부엌 뒤편에 한 채 등 모두 세 채가 덧붙여져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나는 재산에 맞춰 안채 역시 좌우로 뒤로 자꾸 날개채가 덧붙어 특이한 모양이 됐다.
이외에도 마구간과 말을 기르는 사람들이 묵었던 마부집, 조상을 모시는 사당, 아이들을 가르쳤던 서당까지 갖추고 있다.
여기에 노비들이 살았던 초가인 호지집 3채까지 합하면 고택의 전체 규모가 총 125칸에 달한다.
집의 규모를 말할 때 흔히 쓰는 칸(간:間)은 건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 칸살의 넓이를 재는 단위다. 1칸은 통상 사방 6자(1자는 30㎝로 6자는 1.8181m)를 말한다.
조선 시대에는 왕궁이 아닌 이상 100칸이 넘는 집을 지을 수 없도록 했다. 그래서 최대한 넓게 지을 수 있는 민가 건물의 규모가 99칸이었다.
매간당 역시 지어질 때부터 100칸을 넘는 규모는 아니었다고 한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 당시 건물 일부가 소실돼 중축하고 생활에 편리하도록 여러 채를 덧대는 과정에서 100칸 이상으로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안채는 뒤뜰을 통해 서당채와 곧바로 연결된다. 끼니때마다 음식을 해 날라야 했던 여자들을 배려한 동선 구성이다.
서당채는 집안의 자제뿐 아니라 마을에 살던 아이들까지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다고 한다.
대청 양쪽으로 동채와 서채를 두고 있다. 이는 향교에서나 볼 수 있는 구조라고 한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반들반들한 대청 마룻바닥에 둥글게 패인 부분이 있어 눈길을 끈다. 물벼루다.
여기에 물을 담아 두고 붓끝에 물을 찍어 마룻바닥을 종이 삼아 글씨를 쓰고 난초도 그렸다고 한다. 종이가 귀했던 시절의 이야기다.
◇ 돌담 따라 느릿느릿 시간여행
집을 둘러싼 돌담을 따라 느릿느릿 고택을 한 바퀴 돌아봤다. 바스락바스락 낙엽 밟는 소리가 정겹다.
갖가지 모양을 한 돌담에서는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가공하지 않은 돌과 흙을 쌓아 만든 옛 토석담이 곳곳에 그대로 남아 있다.
흙을 층층이 다져 쌓은 판축담도 있고, 기와를 넣어 만든 와편담도 보인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고택이 옛 모습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도 시간과 바람에 맞서 고택을 지켜온 이 담장 덕분인 것 같다.
읍내에 나가 저녁을 먹고 돌아오니 어느새 사방이 어두컴컴해졌다.
고택 체험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고택의 밤'이다. 스무 명 남짓한 청중이 서당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다.
양쪽 방문을 여니 제법 널찍한 무대가 만들어졌다. 서당 마루를 환하게 비추는 달빛 아래 아쟁과 가야금, 판소리 가락이 울려 퍼진다.
평소 접하기 힘든 거문고도 등장했다. 가냘픈 가야금과 달리 낮고 깊게 울려 퍼지는 소리가 매력적이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쭈뼛쭈뼛했던 청중들도 어느새 흥에 겨워 어깨를 들썩인다.
소리꾼이 뽑아내는 춘향가 가락에 '얼쑤∼', '좋다∼' 추임새가 절로 나온다.
미지근했던 방바닥이 어느새 뜨끈 달아올랐다.
※ 이 기사는 연합뉴스가 발행하는 월간 '연합이매진' 2020년 11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isunn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11/25 07:30 송고

![매간당 고택 사랑채 앞마당에서 본 2층 구조의 솟을대문 [사진/전수영 기자]](http://img8.yna.co.kr/etc/inner/KR/2020/10/16/AKR20201016058100805_15_i_P4.jpg)
![대문에 올려진 누각의 팔작지붕에 '삼효'라는 글씨가 쓰여 있다. [사진/전수영 기자]](http://img9.yna.co.kr/etc/inner/KR/2020/10/16/AKR20201016058100805_09_i_P4.jpg)
![대문을 받치는 아름드리나무 기둥의 휨새가 멋스럽다. 왼쪽 큰 대문은 지체 높은 어른이 가마를 타고 드나들 때만 열렸던 문이라고 한다. [사진/전수영 기자]](http://img3.yna.co.kr/etc/inner/KR/2020/10/16/AKR20201016058100805_10_i_P4.jpg)
![매간당 고택 대문 위에 올려진 2층 누각에는 '삼효문'이라고 쓰인 현판이 걸려 있다. 이 현판은 고종의 형인 이재면이 쓴 것이다. [사진/전수영 기자]](http://img6.yna.co.kr/etc/inner/KR/2020/10/16/AKR20201016058100805_13_i_P4.jpg)
![연안 김씨 직강공파는 효자상을 3대에 걸쳐 받은 집안이다. 솟을대문 위에 올려진 누각에는 왕이 이들의 효행을 기려 내린 현액이 걸려 있다. [사진/전수영 기자]](http://img7.yna.co.kr/etc/inner/KR/2020/10/16/AKR20201016058100805_14_i_P4.jpg)
![누각에서 내려다본 사랑채 [사진/전수영 기자]](http://img5.yna.co.kr/etc/inner/KR/2020/10/16/AKR20201016058100805_03_i_P4.jpg)
![오랜만에 손님을 맞은 고택 마당에 장작불 지피는 구수한 연기가 가득하다. [사진/전수영 기자]](http://img1.yna.co.kr/etc/inner/KR/2020/10/16/AKR20201016058100805_07_i_P4.jpg)
![사랑채에서 중문을 지나면 여자들의 공간인 안채다. [사진/전수영 기자]](http://img3.yna.co.kr/etc/inner/KR/2020/10/16/AKR20201016058100805_05_i_P4.jpg)
![서당채 뒤뜰에 낙엽이 가득하다. [사진/전수영 기자]](http://img7.yna.co.kr/etc/inner/KR/2020/10/16/AKR20201016058100805_01_i_P4.jpg)
![서당채 마룻바닥에 움푹 팬 부분은 물벼루다. 종이가 귀했던 시절, 여기에 물을 담아 두고 붓에 물을 찍어 마룻바닥을 종이 삼아 글씨 연습을 했다. [사진/전수영 기자]](http://img4.yna.co.kr/etc/inner/KR/2020/10/16/AKR20201016058100805_11_i_P4.jpg)
![고택을 둘러싼 돌담에서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사진/전수영 기자]](http://img5.yna.co.kr/etc/inner/KR/2020/10/16/AKR20201016058100805_12_i_P4.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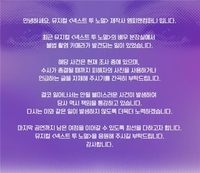









![[영상] 1km 거리서 동전크기 '쾅'…'1만7천원' 레이저무기 우크라 간다](http://img0.yna.co.kr/mpic/YH/2024/04/16/MYH20240416015500704_P4.jpg)
![[영상] 일본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정부, 주한공사 불러들여 항의](http://img3.yna.co.kr/mpic/YH/2024/04/16/MYH20240416015600704_P4.jpg)
![[영상] '먼저가' 손짓 휙휙!…"친구라서 마라톤 우승 양보" 중국 발칵](http://img8.yna.co.kr/mpic/YH/2024/04/16/MYH20240416014400704_P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