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AI 연구 암흑기'에 우리나라만 푸른 싹을 틔운 비결
송고시간2020-12-23 08:01
'AI의 겨울' 1980년대에 김진형 교수 등 1세대 연구자 헌신이 밑거름
"카이스트도 연구비로 SW 샀더니 화내…한글 처리 열망이 토대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인공지능(AI) 연구 분야의 '지구적 겨울'로 간주되는 기간인 1980년대에 한국의 AI 연구는 봄을 맞았다."
23일 IT업계에 따르면, 신유정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연구교수는 지난해 국제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학술 저널에 기고한 논문 초록에 이렇게 썼다.
신 교수 표현처럼 AI 기술은 1950년대에 하나의 학문·연구 분야로 태동한 이후 미래 혁신 기술로 크게 주목받았으나, 1980년대 들어 학계가 급격히 쪼그라들면서 암흑기를 맞았다.
당시 AI 연구자들이 인류의 미래를 변혁할 것처럼 연구 성과를 홍보했으나, 실제 사람들의 실생활을 바꾸는 기술은 내놓지 못한 탓이었다.
이 시기를 학계에서는 'AI의 겨울'(AI Winter)이라고 부른다. 이후 1990년대부터 AI 기술 개발의 주도권은 돈줄을 손에 쥔 IT 기업들에 넘어간다.
그런데 이런 1980년대에 아직 'AI 불모지'였던 한국에서는 되레 AI 연구의 새싹이 빠르게 성장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한국정보과학회는 22일 한국 AI 연구 분야 발전사를 구술 기록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국내 1호 인공지능 박사'로 불리는 김진형 카이스트 명예교수(가운데)는 세미나에서 '초기의 한국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무엇을 고민했는가?' 주제로 발표했다.[줌 세미나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img1.yna.co.kr/etc/inner/KR/2020/12/22/AKR20201222150300017_01_i_P4.jpg)
한국정보과학회는 22일 한국 AI 연구 분야 발전사를 구술 기록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국내 1호 인공지능 박사'로 불리는 김진형 카이스트 명예교수(가운데)는 세미나에서 '초기의 한국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무엇을 고민했는가?' 주제로 발표했다.[줌 세미나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정보과학회는 22일 한국 AI 분야의 발전사를 구술 기록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줌(Zoom)으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김진형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초기의 한국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무엇을 고민했는가?'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에서 컴퓨터공학 박사를 취득했다. 카이스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센터 소장,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초대 소장, 인공지능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 교수는 '국내 1호 인공지능 박사'로 불리기도 한다. 그가 미국에서 귀국해 카이스트 교수로 부임한 1985년을 국내 학계에서는 'AI 원년'이라고 부른다.
김 교수는 "사실 1980년대 이전에도 AI 관련 연구자는 있었지만, AI라는 말을 안 썼다"며 "내가 들어와서 학회를 만드니까 나이 있는 교수님이 전화해서 '내가 인공지능 먼저 하고 있었던 것 알지'라고 하시기도 했다"며 웃었다.
김 교수는 귀국 당시 정부에서 '해외 과학자 유치 국가 프로젝트'라며 이삿짐 비용 정도를 대줬다고 한다.
그는 "국가에서 챙겨준다니까 자부심을 느꼈다"며 "어머니는 아들을 경찰이 지켜준다고 동네에 자랑도 했다"고 회고했다.
대접을 받으면서 AI 연구를 시작했지만, 사실상 '맨땅에 헤딩'이었다.
김 교수는 "연구비가 없었는데, 과기부(당시 과학기술처)에서 국가과제에 AI도 끼워주겠다고 해서 1986년에 1억2천만원을 받았다"며 "6개 소과제로 2천만원씩 다른 연구자들과 나눴다. 아마 국가에서 AI 분야에 준 최초의 연구개발(R&D) 과제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국민소득이 2천500불 정도였다. 사회 전체적으로 컴퓨터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했다"며 "카이스트만 해도 연구비로 소프트웨어를 샀더니 CD를 보고는 '이게 몇백만 원짜리냐'며 화를 내곤 했다"며 웃었다.
김 교수가 척박한 연구 환경에서 AI의 싹을 틔우기 위해 노력한 것은 세 가지였다. 학생 교육, 연구자 교류, 그리고 한국의 독자적인 연구 분야 개발이었다.
당시 국내에는 학생들에게 AI를 가르칠 교수가 몇 명 없었고, 한국어로 AI를 가르칠 전공 서적도 없었다.
김 교수는 다른 대학의 비전공 교수들에게 AI 강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동료 연구자들과 전공 서적을 번역하며 연구 토양을 다졌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김 교수가 가장 많이 했던 고민은 '어떤 연구를 해야 하나'였다.
그는 "과학자로서 글로벌 차원의 기술을 개발하고 논문을 쓸지, 아니면 공학도로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풀지 고민했다"며 "결국 우리 문제를 풀자는 쪽에 더 가치를 두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그는 1985년에 AI 연구자를 모아 '인공지능연구회'를 만들었다.
인공지능연구회는 1989년 10월 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존슨강당에서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첫해였는데도 논문 55편을 발표하며 대규모로 열렸다. 전산학·전자공학부터 물리학·언어학·심리학·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가 컴퓨터와 한글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김 교수는 "카이스트 김길창·조정완·전길남·권용래 교수님, 서울대 김영택·황희용·성굉모 교수님 등 원로 교수님들이 다들 논문을 내셨다"며 "한국어 처리 문제에 관한 열망이 국내 AI 학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회고를 마무리하면서 김 교수는 후배 연구자들에게 조언해달라는 질문을 받자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면 된다. 내가 했던 것을 너희도 해라,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손사래를 쳤다.
다만 그는 "최근 AI가 정보과학이나 컴퓨터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젊은 연구자들은 다소 가벼운 주제를 다루는 것 같기도 하다"며 "공동체 의식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후배들이 사회에 공헌하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승수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오영환 카이스트 명예교수 등 다른 1세대 AI 연구자들도 참석해 전공 분야의 초기 연구 상황을 증언했다.
한국을 넘어 '아시아의 인터넷의 아버지'로 불리는 전길남 카이스트 명예교수도 참석했다.
전 교수는 "이런 자리가 다음 세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세미나 사회를 본 최호진 카이스트 전산학과 교수는 "국내 컴퓨터 발전사를 워크숍 형태로 구술 기록하자고 제안한 분이 전 교수님"이라고 귀띔했다.
hy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12/23 08:01 송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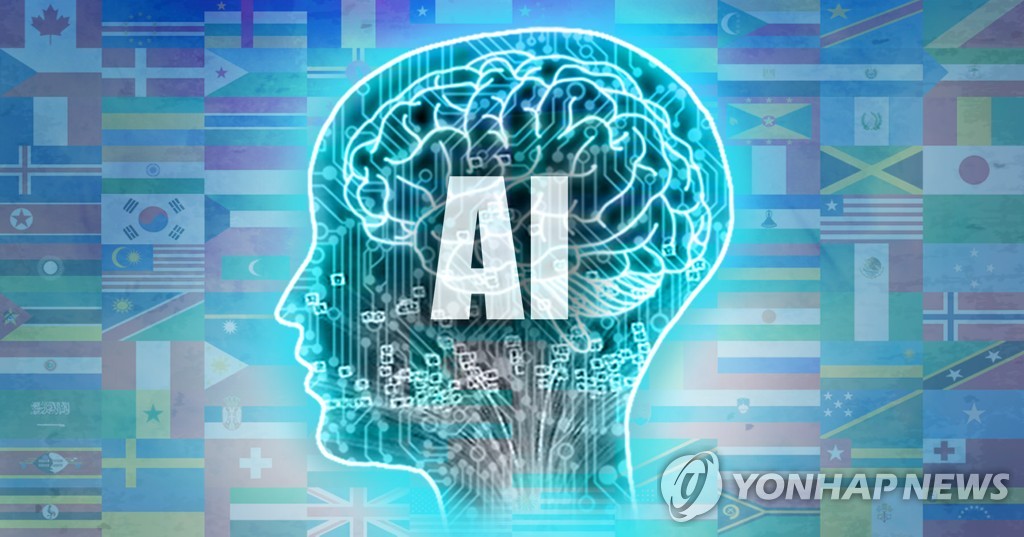
![[줌 세미나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img2.yna.co.kr/etc/inner/KR/2020/12/22/AKR20201222150300017_02_i_P4.jpg)
![전길남 카이스트 명예교수 [줌 세미나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img3.yna.co.kr/etc/inner/KR/2020/12/22/AKR20201222150300017_03_i_P4.jpg)








![[2보] "이스라엘 미사일, 이란 내 목표물 타격"<미 ABC방송>](http://img5.yna.co.kr/photo/etc/up/2024/04/15/PUP20240415005301009_P2.jpg)
![[영상] '충격적' 칠레 시골 첨단 대마농장…"중국 마피아 연관 가능성"](http://img1.yna.co.kr/mpic/YH/2024/04/19/MYH20240419007300704_P4.jpg)
![[영상] 이란군 핵사령관 "이스라엘이 핵시설 공격하면 핵원칙 재검토"](http://img0.yna.co.kr/mpic/YH/2024/04/19/MYH20240419008500704_P4.jpg)
![[영상] 아낌없이 주는 대리모 해달…새끼는 어미 배 위에서 '쿨쿨'](http://img7.yna.co.kr/mpic/YH/2024/04/18/MYH20240418011800704_P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