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zine] 봄이 오는 길목 ③ 겨울 문지방 너머 온 햇살 따라, 보길도
송고시간2022-03-24 08:00
(완도=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집안 해피트리, 돈나무에서는 연둣빛 새잎과 가지가 벌써 돋았다. 저 멀리 남쪽 봄소식이 궁금해 길을 나섰다. 고산(孤山) 윤선도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보길도로.
고산의 부용동 원림에서 만난 직박구리 동박새는 새빨간 동백꽃에 머리를 박고 이른 봄을 먹고 있다. 망끝전망대에 서니 멀리 제주도가 아른거린다. 봄은 제주쯤 왔으려나. 보길도를 징검다리 삼아 남도 바다를 건너 어서 봄이 왔으면!
◇ 겨울 문지방 너머 온 햇살 따라
"산이 사방으로 둘러 있어 바닷소리 들리지 않으며, 천석이 참으로 아름다워 물외의 가경이요 선경이라"
고산 윤선도가 격자봉에 올라 보길도의 자연을 격찬한 말이다. 남쪽의 섬에서 굳이 바닷소리가 들리지 않아 좋다니, 알 수 없는 선문답이다. 그래도 햇살 좋은 날 아침에 보길도 여행을 시작하려니 산이 높고 좋다는 건 바로 알만하다. 동쪽 바다에는 해가 오른 지 한참인데도 산 너머 자리 잡은 고산의 유적지들에는 여전히 음지가 많다. 보길도 여행은 햇살 따라가는 게 좋겠다.
◇ 보길도 삶의 터전에서 해맞이
예송리의 갯돌해변은 보길도에서 최고의 일출 감상 장소다. 2월엔 아침 7시 20분께 완도군 소안도 끝머리 위쪽으로 해가 오른다. 멀리 보길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전복양식장이 붉게 변한다. 예송항에 정박한 배들도 아침햇살을 받아 살짝 붉어진다. 어부들의 뱃길은 진작부터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황금 햇살이 바다를 길게 뻗어 오니, 물오리 두 마리가 바다를 가르고 어부들도 뒤따른다. 해변 갯돌도 황금빛을 띤다. 눈이 멀 지경으로 눈부시다. 갯돌 사이사이를 오가는 투명한 바닷물을 보고 있으니 눈이 밝아지고, 파도와 구르는 갯돌 소리를 들으니 귀가 맑아지는 느낌이다.
◇ 신선놀음 맛보는 동천석실
예송리 바다에서 일출을 보고 산기슭을 따라 돌아 고산의 부용동 원림으로 향했다. 한국의 3대 전통 정원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다. 부용동 원림은 크게 3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동천석실, 낙서재와 곡수당, 그리고 세연정이다. 바다에 해가 뜬 지 1시간여가 지났는데, 동쪽 산기슭에 자리한 동천석실은 햇살이 비치고, 서쪽의 낙서재와 계곡에 자리한 세연정은 여전히 그늘이 졌다.
동천석실은 돌다리를 건너 15분 정도 산을 올라야 한다. 조금 가파른 길도 나오지만 그리 힘들지 않다. 가는 산길 곳곳에 돌탑들이 보인다. 상록수들 틈을 비집고 들어온 햇살이 작은 돌탑 하나를 스포트라이트처럼 비춘다. 무릎높이로 잘린 동백나무 줄기에 쌓은 돌탑도 있다.
동천(洞天)은 신선이 사는 곳이라는 뜻이다. 윤선도는 이곳에서 차를 끓여 마시며 부용동 계곡을 바라보곤 했다고 한다. 차바위가 따로 있을 정도다. 한 평 정도 바위에 홈을 파 작은 탁자를 놓을 수 있게 만들었다. 텀블러에 따뜻한 커피나 차를 담아 오지 않은 게 후회스럽다. 도르래로 산 아래에서 음식을 나를 때 사용했다는 용두암도 있다. 경치 좋은 곳에서 차와 음식을 즐길 수 있으니 딱 신선놀음하기 좋은 곳이다.
낙서재와 부용동 계곡을 바라보고 잠시 서서 봄기운을 맞아본다. '휘이~ 휘이' 산새가 숲에서 울면, '꼬끼오~ 꼬끼오' 닭이 부황리 마을에서 화답한다. 찬 기운을 몰아내는 따뜻한 햇볕에 마음이 푸근해진다.
◇ 인간 세상 낙서재·곡수당
낙서재 주차장의 돌담 옆 동백나무가 바스락거린다. 살그머니 다가가 보니 동박새가 나무 사이를 오간다. 연두색의 몸 깃털과 눈 주위에 하얀 테두리가 있는 작은 새다. 붉은 동백꽃 꽃잎을 발가락으로 움켜잡고, 머리를 넣어 동백꽃을 먹고 있다.
낙서재는 윤선도가 보길도에서 살았던 곳이다. 집터를 잡기 위해 깃발을 단 장대를 들고 사람이 격자봉을 오르내리게 했다. 낙서재 앞에 넓게 판 터에 거북 형상의 큰 돌을 두었다. '귀암'이다. 윤선도가 달맞이하던 곳이다. 아침에 격자봉을 넘어오는 해를 맞기에도 좋은 자리다.
낙서재 뒤로는 소은병이 있다. 7개의 계곡과 삼각형의 못을 가진 서너 평 넓이의 작은 바위산이다. 아직 못은 얼어있었지만, 빗물이 넘치면 낙서재 아래로 물줄기가 흘러내린다고 한다. 소은병은 성리학을 완성한 주자와 관련된 봉우리 이름이다.
낙서재 터 아래에는 곡수당이 있다. 윤선도의 아들 학관이 골짜기에서 내려온 물이 굽이굽이 휘돌아 흐르는 곳에 조성한 거처다. 곡수당에는 상연지, 하연지 두 개의 연못도 있다. 나무에 홈을 파서 만든 수로가 숲에서부터 길게 이어져 인상적이다. 수로 끝에서 물은 돌로 만든 큰 그릇에 담기고, 물이 차면 맞은편 상연지로 떨어지게 된다.
◇ '예악'(禮樂)'을 즐기던 세연정
세연정은 보길도 고산의 유적지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곳이다. 윤선도는 부용동 여러 골짜기에서 흘러온 계곡물을 판석보로 가두어 연못을 만들고 세연지(洗然池)라 이름 지었다. 그리고 정자인 세연정을 중앙에 앉혔다. 세연정 좌우에 군무를 추는 무대인 동대와 서대를 흙과 돌로 쌓았다. 지금은 동백나무들이 무희를 대신한다.
연못도 세연정을 사이로 계담과 회수담으로 나누고. 사투암, 혹약암 등 빼어난 바위 7개, 칠암을 배치했다. 버선코를 닮은 사투암에서는 맞은편 산 중턱 바위 지대인 옥소대를 향해 발을 딛고 활을 쏘았다. 옥소대에서 무희들이 춤을 추면 세연지에 비친 그림자를 보며 예악을 즐겼다.
세연정은 가운데에 온돌방을 두고, 주변에 마루를 둘렀다. 동대와 서대 방면으로 한 단을 높여 마루를 만들었고, 건물 사방으로 창호 문을 위로 들어 걸 수 있게 했다. 온돌방에 불을 때면 일명 굴뚝 다리인 판석보로 연기가 빠져나가게 설계했다.
신발을 벗고 세연정 마루에 올랐다. 정오가 다 되어가도 볕이 잘 들지 않아 발이 차다. 드문드문 볕 든 곳에 서니 세연지에 오래 머물 만하다. "붉은 꽃이 흘러오니 무릉도원이 가깝도다." 윤선도가 어부사시사 춘사(春詞)에서 노래했지만, 아직은 봄이 이르다.
세연지를 떠나려는데, 이번엔 동백나무가 시끌벅적하다. 직박구리들이 동백꽃으로 동네잔치 중이다. 새빨간 동백꽃에 직박구리 한 마리가 연신 부리를 넣더니 부리가 노랗게 변했다. 머리를 흔드니 노란 꽃가루가 보길도에 흩뿌려진다.
※ 이 기사는 연합뉴스가 발행하는 월간 '연합이매진' 2022년 3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zji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2/03/24 08:00 송고

![보길도 낙서재에서 동박새가 붉은 꽃잎을 움켜잡고 동백꽃을 먹고 있다. [사진/진성철 기자]](http://img4.yna.co.kr/etc/inner/KR/2022/02/15/AKR20220215037300805_03_i_P4.jpg)
![세연정의 새빨간 동백꽃잎 안에 노란 꽃가루가 흩뿌려져 있다. [사진/진성철 기자]](http://img6.yna.co.kr/etc/inner/KR/2022/02/15/AKR20220215037300805_05_i_P4.jpg)
![세연정과 동백꽃 [사진/진성철 기자]](http://img7.yna.co.kr/etc/inner/KR/2022/02/15/AKR20220215037300805_06_i_P4.jpg)
![예송리 갯돌해변에서 바라본 일출. 어부의 배가 붉어진 바다 전복양식장 사이를 가른다. [사진/진성철 기자]](http://img8.yna.co.kr/etc/inner/KR/2022/02/15/AKR20220215037300805_07_i_P4.jpg)
![예송항에 정박한 배들이 일출 때 살짝 붉어진다. [사진/진성철 기자]](http://img9.yna.co.kr/etc/inner/KR/2022/02/15/AKR20220215037300805_08_i_P4.jpg)
![낙서재 기와지붕 너머로 바라본 동천석실. [사진/진성철 기자]](http://img0.yna.co.kr/etc/inner/KR/2022/02/15/AKR20220215037300805_09_i_P4.jpg)
![동백나무 줄기 위에 쌓은 돌탑. [사진/진성철 기자]](http://img2.yna.co.kr/etc/inner/KR/2022/02/15/AKR20220215037300805_10_i_P4.jpg)
![동천석실 차바위. 홈을 파 차 탁자를 놓을 수 있게 했다. [사진/진성철 기자]](http://img3.yna.co.kr/etc/inner/KR/2022/02/15/AKR20220215037300805_11_i_P4.jpg)
![동천석실과 부용동 계곡. [사진/진성철 기자]](http://img4.yna.co.kr/etc/inner/KR/2022/02/15/AKR20220215037300805_12_i_P4.jpg)
![윤선도가 거처했던 낙서재(오른쪽)와 달맞이를 하던 귀암(왼쪽). [사진/진성철 기자]](http://img5.yna.co.kr/etc/inner/KR/2022/02/15/AKR20220215037300805_13_i_P4.jpg)
![낙서재와 소은병. 소은병의 작은 못이 아직 얼어있다. [사진/진성철 기자]](http://img6.yna.co.kr/etc/inner/KR/2022/02/15/AKR20220215037300805_14_i_P4.jpg)
![윤선도의 아들 학관이 조성한 곡수당. [사진/진성철 기자]](http://img7.yna.co.kr/etc/inner/KR/2022/02/15/AKR20220215037300805_15_i_P4.jpg)
![나무에 홈을 파서 만든 수로. 숲에서부터 곡수당 상연지로 이어진다. [사진/진성철 기자]](http://img8.yna.co.kr/etc/inner/KR/2022/02/15/AKR20220215037300805_16_i_P4.jpg)
![세연정 마루에서 바라본 세연지. [사진/진성철 기자]](http://img9.yna.co.kr/etc/inner/KR/2022/02/15/AKR20220215037300805_17_i_P4.jpg)
![세연정과 세연지 [사진/진성철 기자]](http://img0.yna.co.kr/etc/inner/KR/2022/02/15/AKR20220215037300805_18_i_P4.jpg)
![옥소대에서 내려 본 세연정. 옥소대를 향해 발을 딛고 활을 쏘았다는 사투암에 관람객이 서 있다. [사진/진성철 기자]](http://img1.yna.co.kr/etc/inner/KR/2022/02/15/AKR20220215037300805_19_i_P4.jpg)
![일명 굴뚝다리로 불리는 판석보 [사진/진성철 기자]](http://img3.yna.co.kr/etc/inner/KR/2022/02/15/AKR20220215037300805_20_i_P4.jpg)
![세연지에서 직박구리가 연신 동백꽃을 먹더니 부리가 노랗게 변했다. [사진/진성철 기자]](http://img2.yna.co.kr/etc/inner/KR/2022/02/15/AKR20220215037300805_21_i_P4.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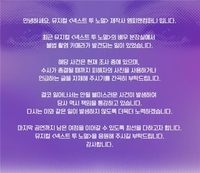







![[영상] 1km 거리서 동전크기 '쾅'…'1만7천원' 레이저무기 우크라 간다](http://img0.yna.co.kr/mpic/YH/2024/04/16/MYH20240416015500704_P4.jpg)
![[영상] 일본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정부, 주한공사 불러들여 항의](http://img3.yna.co.kr/mpic/YH/2024/04/16/MYH20240416015600704_P4.jpg)
![[영상] '먼저가' 손짓 휙휙!…"친구라서 마라톤 우승 양보" 중국 발칵](http://img8.yna.co.kr/mpic/YH/2024/04/16/MYH20240416014400704_P4.jpg)


